20대엔 다소 가벼운 편이었다.
물에 빠지면 입만 뜨겠다는 소리에, 아니라고. 입을 날개 삼아 날아오를 수 있다고 답했다. 낯을 가린다는 소리는 아무도 믿지 않았고, 영업인데 개발자로 잘못 입사한 거 아니냐는 소리도 들었다. 아무튼 20대엔 그랬다.
언제부터 이리 무거워졌나 싶었는데, 20대에 알고 지내던 친구를 서른즘 만나서 나눴던 대화가 생각난다. ‘근데, 오빠 원래 이랬나? 되게 차분하네요.’ 몇달 전 만난 대학 선배는 ‘오세용이 나이 먹더니 변했네. 언제나 30cm는 붕 떠 있었는데.’ 변했다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닌 걸 보면 변하긴 했나보다.
그런데 이게 최근엔 고민이다. 차분해지는 건 좋다만, 텐션 자체가 마땅히 올라가질 않는다. 어쩌다보니 모든 일정에 목적이 있다. 휴식도 일을 잘 하기 위한 컨디션 조절의 목적이 됐다. 운동은 백팩을 메도 허리가 아프질 않을 정도의 근력을 기르는 용도이고, 간간히 정해둔 활동은 독서와 투자 등 업무 시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가 됐다.
아니, 어쩌다 이리 재미없는 아재가 됐을까.
떡볶이 하나에 행복해지는 동료들을 보고 있자면 때론 부럽다. 그저 집에 돌아가 침대에서 귤 까먹는 생각에 행복하다는 말을 듣자면, ‘이불 더러워지지 않나? 그게 왜 행복하지?’라는 생각부터 든다. 그러면 너는 언제 행복하냐는 질문에 말문이 막히는 걸 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하다.
종종 가벼워지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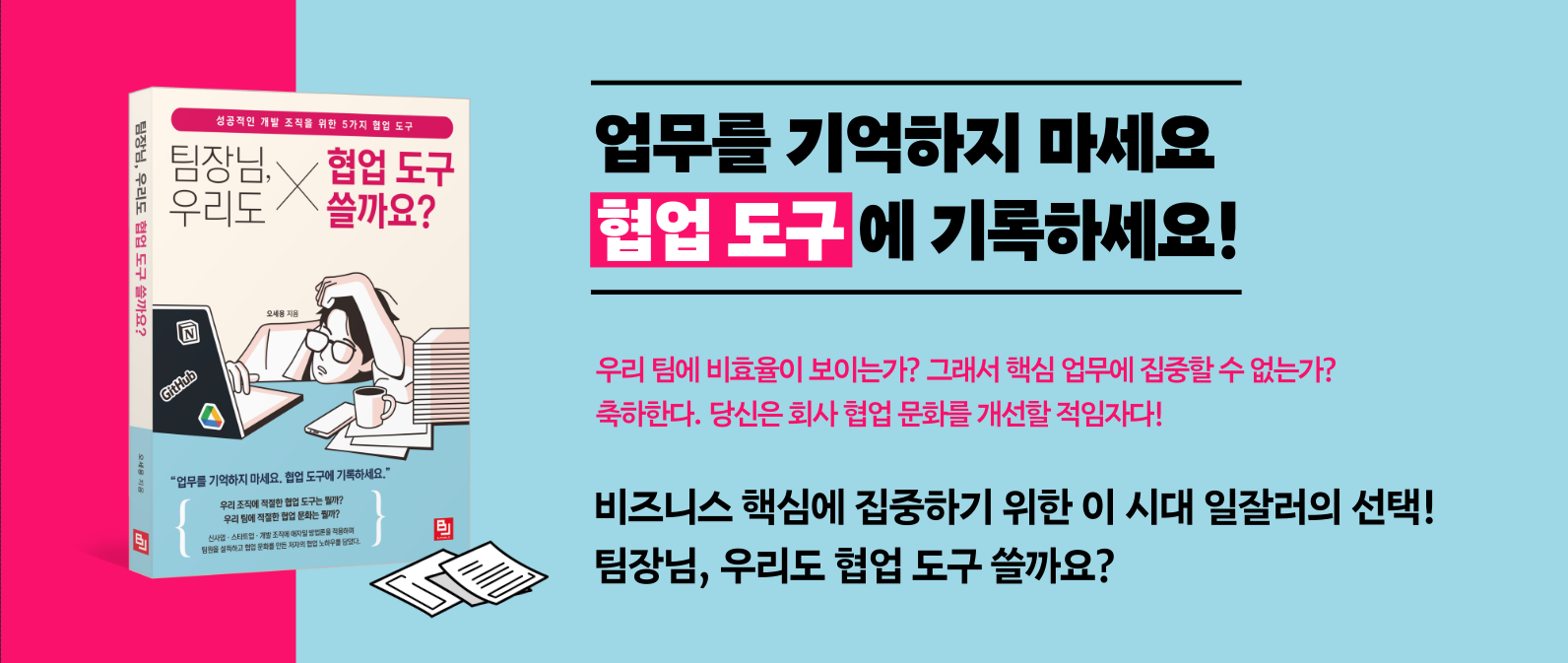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