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하고 싶은게 많아졌다.
한동안 무기력증에 빠졌다. 세상사 모든게 시시해보이고, 그래 노력해서 얻으면 무엇하나 싶더라. 무얼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았고, 주위 사람에게 짜증이 늘었다. 그런 스스로가 미워지니 그냥 다 싫더라.
그렇게 한 달. 그냥 나는 번아웃이었나보다. 이래저래 일을 벌이기도 했고, 어디서든 중요하게 쓰이길 원하니 어디서든 잘 해야만 했다. 그걸 원했지만, 스트레스였고. 그걸 원했지만, 원하지 않게 되더라.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내 번아웃을 해소해준 건 내가 좋아하지 않던, 아니 싫어하던 술이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산토리 월드위스키 AO>를 마시게 됐는데, 마침 이게 한국에 정식 수입되지 않는 술이었다. 이래저래 검색하다 보니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걸 확인했고,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술을 검색하다 보니 이런저런 술을 알게 됐다. 그렇게 여러 알고리즘에 이끌려 내 집에 무려 ‘술장’이 생겨버렸다.
취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다음날 숙취가 남는게 너무도 싫고, 언젠가부터 회식날 컨디션을 필히 마시곤 했다. 꽤 비싼 컨디션이지만, 다음날 맑은 정신을 산다 생각하면 몇 천원이 아깝지 않았다. 때문에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 맑은 정신을 잃게 하니까.
그런데 위스키는 달랐다. 취해야 의미가 생기는 소주와 달리 위스키는 취하지 않아도 단 한잔으로도 다양한 향을 즐길 수 있다. 뭔 술에서 캬라멜향과 초콜릿향이 나나 싶었는데, 정말 마시다 보니 그런 향이 나더라. 술의 역사를 찾아보고, 그렇게 한 병씩 구매한게 어느새 이렇게 됐다. 불과 한 달 만에 일이다.
그렇게 술은 내가 의욕을 되찾게 해준 어떤 매개체가 됐다. 사실 술이 정말 맛있거나, 너무 좋아서라기보단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기에 좋았다. 술은 여전히 내겐 쓰고, 가끔 역하기도 하다. 그래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향과 맛. 그게 가져오는 다양한 생각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리고 더 다양한 경험을 위해 ‘살고 싶어졌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다. 누군가는 어차피 독한 술이라며 비아냥 거리고, 그거 뭐하러 마시냐며 툭툭대고. 어차피 다 똑같은 술이라며 싸고 빨리 취할 수 있는 소주나 마시라 하고. 그럼에도 코 끝을 찌르는 알콜향 뒤 꽃 향기를 만나고, 초콜릿을 만나고, 바닐라를 만나며. 다 똑같아 보이는 위스키 사이에 나만의 독특한 향을 만드는. 그렇게 누군가에겐 ‘취향’이 되는.
다시 하고 싶은게 많아졌다.
어차피 똑같은 인생이라 보일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누군가에겐 상처를 주고, 받는 똑같은 인간이겠지만. 그럼에도 누군가에겐 ‘취향’이 될지도 모르는 내 인생을, 그럼에도 나만의 향기를 만드는 내 인생을. 다시 열심히 달려보련다.
여전히 세상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게 많을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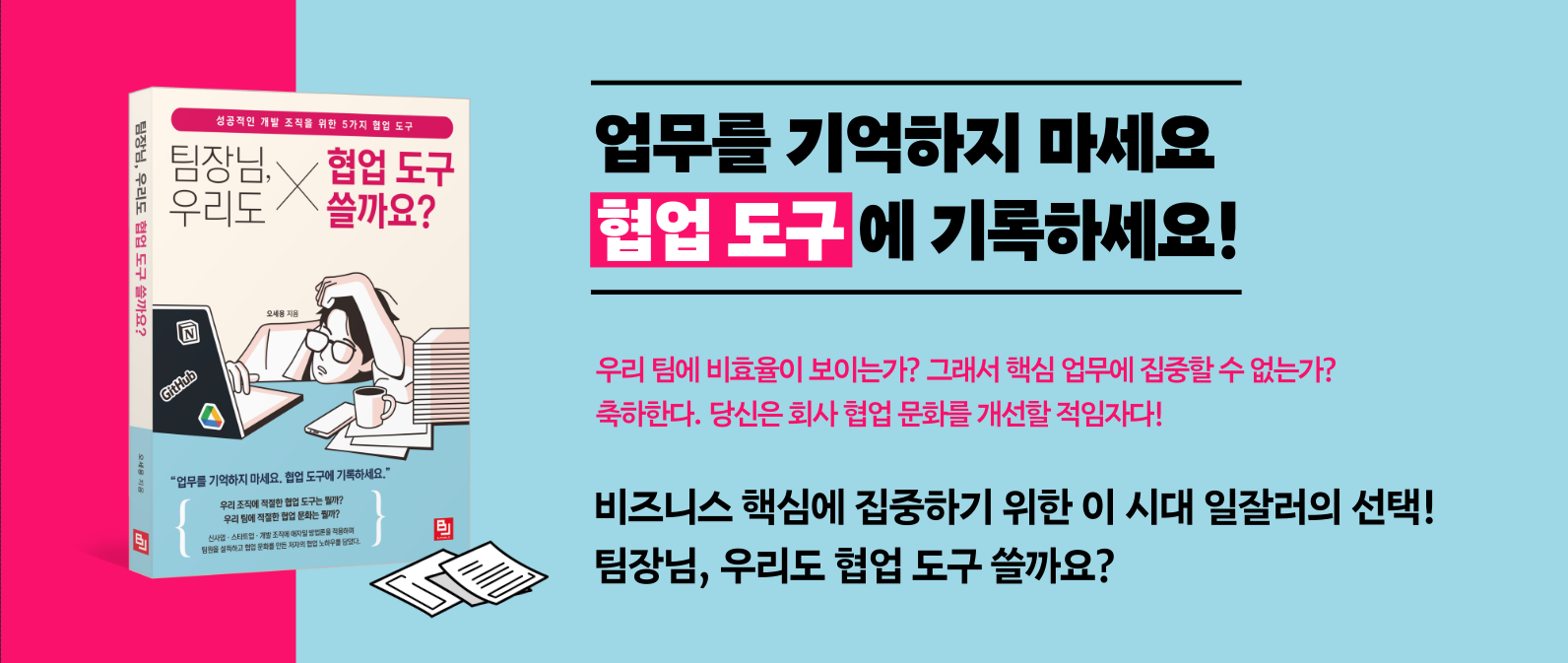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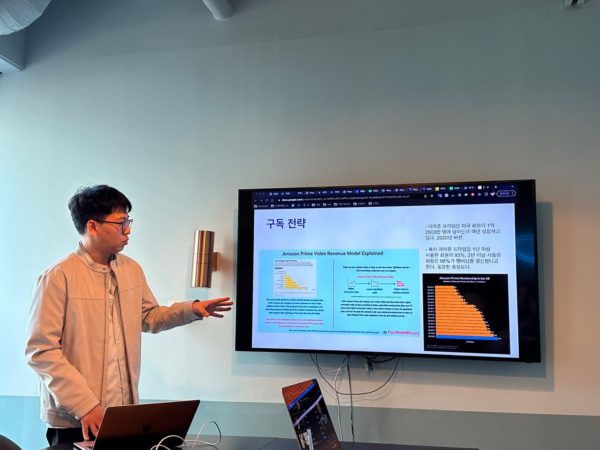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