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이렇게까지 걱정을 달고 지냈던 적이 있나 싶다. 수많은 ‘만약’이 떠오르며 닿는 족족 얽히기 시작한다. 한 가지 걱정이 수십, 수백가지로 늘어나는 과정을 보며 암산으로 풀이를 시도해본다. 어디서부터 시작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
통제된 환경을 좋아하는 편이다. 학창시절엔 스스로 순응하는 편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겁쟁이여서 그랬나보다. 불확실함은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는다. 스타트업 대표 역할을 하며 불확실함을 싫어하니 선택을 당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몇 가지를 통제 하려다 대부분의 것을 잃는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다.
몇 개월 동안 글을 쓰지 못했다. 머리가 복잡하면 글을 쓰며 풀어내라 스스로 말하고 다녔건만, 난생 처음 겪는 수많은 변수에 그저 넋을 놓고 다녔다. 다 고려하려다 보니 되려 무엇도 고려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잠시라도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싶었는데, 언젠가부터 늘상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돼 버린 것 같다. 왜 이리 바보 같이 됐을까.
오세용닷컴에 왜 글을 안 쓰냐고 묻는 지인이 늘어났다. 내 글을 읽는 지인이 간혹 있는 건 알았지만, 글이 올라오지 않는다며 오세용닷컴을 검색해 봤다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이야. 뭐라도 써야겠다 다짐한 게 8월 초였는데, 몇 차례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려보려 했지만 실패한 횟수가 꽤 된다. 책 쓸 때도 이렇게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다.
이대로면 언제쯤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 문제를 푸는 것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른데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를 모르겠으니 숨이 막혔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고, 울상이 됐나보다. 얼마 전 모임에서 근황 토크를 하는데 한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느냐고. 그러면서 농담을 던진다. 그러다 울 것 같다고.
순간 정신이 들었다. 세상에, 나를 통해서 판단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회사, 제품, 팀. 내 모습이 그렇게 한심하게 보인다면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상황인가 싶었다. 내 말을 믿고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안 해본 선택지를 펼쳤다. 비장의 무기라기보다는 내가 설계한 방향성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성이었다.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되는 건 아니다. 다만 조금 더 나은 방향이라 생각한 곳으로 가고 싶었을 뿐이다. 어쩌면 내 자존심과 고집 외 다른 단어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다.
다 내려 놓은 줄 알았는데, 더 내려 놓을 게 있더라. 조금 더, 조금 더 내려 놓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줄 알았건만. 글쎄, 이거 어쩌면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타고난 겁쟁이인지 여전히 겁을 먹고 있었나보다.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떤가. 어차피 완벽한 계획도 아니었으며, 그런 게 있지도 않은데 말이다. 하지만 그래도 완벽에 가까운 계획으로 보답하고 싶었다. 나를 믿는 동료들이며, 고객들에게 말이다. 내가 할 일은 더 나은,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 내는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도 내려 놓아야 한다니. 그간 내 장점이라 생각한 것도 다 내려 놓아야 한다니. 겁쟁이로서 도무지 결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또 선택 당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정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꼭 잘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뎁스 더, 또 한 뎁스 더 파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이 상황이 생각보다 절망적이지 않다. 마치 가슴팍까지 오는 얕은 수영장에서 허우적대던 아이가 된 기분이다.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달라진 거라면, 허우적대던 아이가 바닥에 발을 디뎠다는 것. 억지로 마시던 물을 이제 마시지 않게 됐다는 것. 울음을 그치고 딸꾹질만 꺽꺽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비로소 수영장에 남아서 헤엄을 칠지, 걸어서 밖으로 나올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렇게 선택의 주도권을 손에 쥐었다는 것.
조금 쪽팔리긴 하지만, 아직 물놀이를 더 해도 된다는 사실에 울다가 웃음이 나는 것 같다. 아… 그럼 안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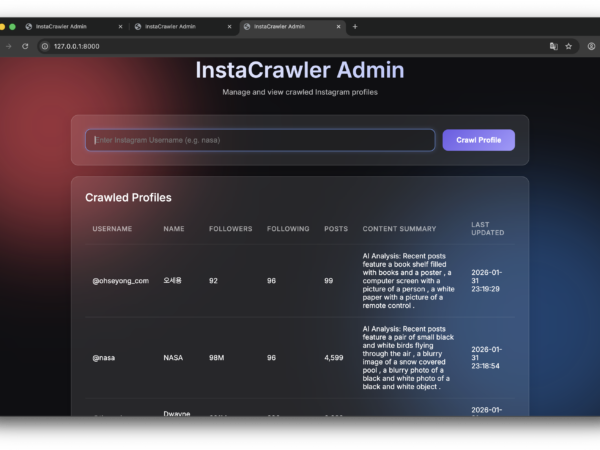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