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이 많은 편이다. 늘 문제를 가지고 살며, 문제가 떨어지면 새로운 문제를 찾는 편이다. 문제가 안 보이면 스스로 만들기도 하니 문제 그 자체이기도 하다. 어쨌든 문제에 관해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다.
문제에 관한 생각도 모두가 방향이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생각을 이불킥에 사용하고, 누군가는 후회에 사용한다. 누군가는 자책에, 누군가는 아쉬움으로 사용한다. 나는 주로 해결을 위해 사용한다. 해결을 위해 원인을 파헤치고, 해결을 위해 후회하고, 해결을 위해 자책한다. 어쩌면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10년 쯤 일하면 전문가가 돼 있을 줄 알았다. 당시 생각했던 전문가란 어떤 분야에서 굉장한 엣지가 있는, 그러니까 너무도 날카로워 스치기만 해도 슉슉 베이는 그런 엣지 말이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의문이 든다. 그런 엣지를 갖는다는 건 어쩌면 망상의 영역일까 하는.
그런데 정말이지 문제 투성이다. 늘 뭔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마주했던 번아웃만 해도 수십 번은 될텐데, 때로는 그릇 이상의 일을 벌여 그릇이 수차례 깨지기도 했는데 말이다. 그래도 나름 결과물을 만들려고 아등바등 했는데, 안전지대도 벗어나보고, 역할도 바꿔보고 늘 더 나아지려 했는데. 엣지는 커녕 문제나 좀 안 보이면 좋겠다 싶다.
성장은 계단식이라 한다. 생각해보면 계단을 오르던 몇몇 지점이 떠오르긴 한다. 그때는 정말 계단을 오르지 못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계단을 오르던 거였더라. 당시 공통점이라 하면 꽤 특이한 경험을 하면서도 굉장히 막막했던 기억이 난다.
조금 위안을 해보자면, 동시에 쥘 수 있는 고민의 가짓수가 더 많아진 것 같긴 하다. 멀티 스레드가 됐다고나 할까. 가끔은 깊이도 조금은 생긴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최근 계단을 오르던 시절처럼 꽤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다. 모든 고민의 결과가 똑같은 곳에 도달한다는 거다.
모든 고민의 결과가 언제부턴가 내 역량으로 이어진다. 조직 생활을 할 때는 늘 해결책이 보였다. 모든 문제는 꼭 내가 풀 필요가 없었다. 때론 상사에게 때론 동료에게 때론 팀원에게 때론 파트너사에게 액션을 요구하면 됐다. 원인을 찾아 어떤 해결책을 낼 수 있다면 액션이 꼭 내 몫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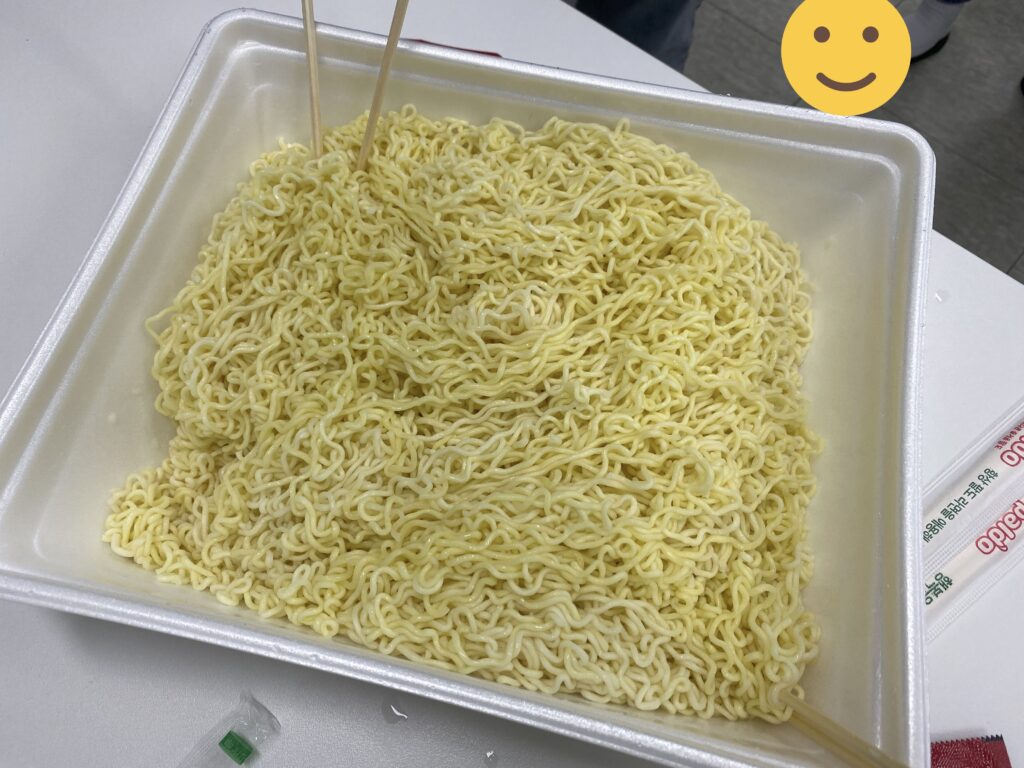
그런데 요즘은 액션까지 내 몫이 되곤 한다. 그 액션을 할 역량이 안 되니 해결책을 찾았다고 볼 수가 없다. 결국 모든 문제의 끝이 내 역량 부족으로 이어진다. 내가 그 경험을 조금만 했더라면, 내가 실무를 조금만 봤더라면, 내가 업계 사람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내가 공부를 조금만 했더라면. 어쨌거나 내가 좀 잘 했더라면.
참 특이한 경험이다. 모든 결론이 내 탓이라니.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데 말이다. 한편으로는 희망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어쩌면 내게 다음 계단이 허락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





Comments